닭 육회, 돼지 족탕…난생처음 먹어본 소감은요 [일일오끼]
[중앙일보] 입력 2021.06.03 05:00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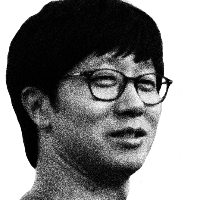
전남 구례-지리산과 섬진강의 신선한 맛

전남 구례 당골식당에서 맛본 닭 육회. 산닭구이를 주문하면 애피타이저처럼 나온다. 왼쪽부터 닭껍질, 모래주머니, 가슴살.
구례군은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다. 2018년 기준 2만7350명이다. 산지가 80%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다. 그렇다고 구례의 맛을 무시할 순 없다. 지리산과 섬진강에서 온갖 신선한 것이 올라와서다. 산채비빔밥이나 다슬기탕만 있는 게 아니다. 닭 육회, 돼지 족탕 같은 별식부터 국산 밀만 고집하는 빵집까지 만날 수 있는 곳이 구례다. 지난달 27~28일 구례에서 즐긴 미각 체험은 기대 이상으로 각별했다.
주문 들어가야 닭 잡는 집
수도권에서 구례를 찾아가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북쪽 산동면이다. 샛노랑 봄소식을 전해주는 산수유 마을이 있는 곳이다. 마을 깊은 곳, 지리산 성삼재 들머리인 당골에 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몇 곳이 있다. 35년 내력을 자랑하는 ‘당골식당’을 찾았다.

구례 당골식당에서 맛본 닭구이. 돼지갈비처럼 양념에 버무린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는다.
주문이 들어가야 닭을 잡는다고 해서 미리 ‘산닭구이(6만원)’를 예약했다. 서너 명이 먹을 수 있는 코스 요리다. 애피타이저는 닭 육회. 가슴살과 모래주머니(닭똥집), 껍질이 한 주먹씩 나왔다. ‘장이 약한 사람은 먹고 배탈이 나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식당 벽에 쓰여 있었다. 기름소금에 조금씩 찍어 먹어봤다. 가슴살은 광어회처럼 부드러웠고, 모래주머니와 껍질은 꼬들꼬들했다. 닭 비린내는 전혀 안 났다.

숯불구이를 먹고나면 닭 뼈 찜과 녹두죽이 나온다. 배가 불러도 다 먹게 된다.
이어 돼지갈비처럼 간장 양념에 버무린 닭고기를 숯불에 구웠다. 바짝 익힌 고기 한 점을 먹어봤다. 간이 세지 않았다. 씹을수록 고소했다. 닭고기란 원래 이런 맛이구나 싶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닭튀김이나 닭갈비, 닭볶음탕으로 만난 닭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다. 고기를 다 먹어갈 때 즈음, 닭 뼈 찜과 닭 녹두죽이 나왔다. 토종닭 특유의 구수한 맛이 돋보였다. 첫 끼니부터 제대로 보양한 기분이었다.
당골식당 김문섭(45) 사장은 100일 된 암탉만 고집한다. 그보다 어리면 먹을 게 없고 늙으면 살이 질겨져서다. 요즘 주중엔 하루 10마리, 주말엔 40마리를 잡는다. 산수유꽃이 만개할 때는 하루 70마리까지 잡는다. 김 사장은 초봄마다 골병이 든다고 한다.
1%만 아는 우리 밀의 맛
요즘 구례는 ‘빵지순례’ 명소로 통한다. 군산 ‘이성당’이나 대전 ‘성심당’ 같은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는 빵집은 없다. 대신 국산 밀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화제가 된 ‘목월빵집’이 있다.

구례읍에 자리한 목월빵집은 100% 국산 밀로 빵을 만든다. 빵 재료로 흔히 쓰는 팥, 밤뿐 아니라 쑥부쟁이, 들기름, 젠피 같은 토속적인 식재료를 활용한 빵도 많다.
장종근(39) 대표가 빵을 시작한 사연이 흥미롭다. 독일 교환학생 시절, 그는 매일 빵을 먹었다. 한국에 돌아와서 독일 빵을 찾았지만 ‘그때 그 맛’을 만날 순 없었다. 10여년 전만 해도 유럽식 천연발효 빵을 만드는 집이 드물었다. 취미 삼아 빵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빵을 배웠고 2016년 고향인 구례에 빵집을 열었다.
목월빵집은 100% 우리 밀만 쓴다. 호밀, 앉은뱅이밀, 고대밀 등을 적절히 섞어서 쓴다. 제피, 쑥부쟁이 같은 지역 식재료도 활용한다. 장 대표는 “우리 밀은 모양내기가 힘들지만 맛과 풍미는 수입산에 뒤지지 않는다”며 “신선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말했다.

목월빵집 장종근 대표는 독일 유학 시절 먹던 빵 맛을 기억하며 취미로 빵을 만들다가 제빵사가 됐다. 목월빵집에서는 물레방아, 달구지 등 빈티지 제품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다.
한국인은 쌀 다음으로 밀을 많이 먹는다. 그러나 국산 밀 자급률은 1% 수준이다. 1970년대 수입산에 밀려 고사했던 국산 밀을 1990년대 어렵게 되살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입 밀을 주식으로 먹는다. 90년대 우리 밀 복원 운동이 구례에서 시작됐었다. 구례에 목월빵집이 존재하는 건 우연이 아닐 테다.
목월빵집의 빵 맛은 처음엔 심심했다. 그러나 씹을수록 고소하고 향긋하다. 많이 먹어도 더부룩하지 않았다. 여러 빵 중에서 쑥부쟁이 치아바타(4000원)가 인상적이었다. 들기름과 대추를 넣은 치아바타는 중독성이 강했다. 어린이 팔뚝만 한 빵 한 덩이를 야금야금 다 먹었다.
순면 이불 같은 가오리 살결
배도 꺼뜨릴 겸 섬진강 둑길을 걸었다. 굽이치는 강 뒤편으로 너른 들녘과 넉넉한 지리산 산세가 한눈에 들어왔다. 한데 강가의 나무가 죄 물살 방향으로 누워 있었다. 홍수 피해의 흔적이다. 지난해 8월 사흘간 500㎜의 물 폭탄이 구례에 쏟아졌었다.

구례읍 동아식당에서 맛본 돼지 족탕. 국물이 제법 얼큰해서 느끼한 족발과 궁합이 좋다.
당시 구례읍의 모든 식당이 큰 피해를 당했다. 저녁에 찾은 ‘동아식당’도 마찬가지였다. 기와 높이까지 차오른 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아식당이 술꾼의 아지트라는 사실은 변함없었다. 이른 저녁부터 땀내 풍기는 사내들이 거나하게 취해 술잔을 부딪고 있었다. 동아식당의 명물 돼지 족탕과 가오리찜을 곁들이며.
예부터 구례에서는 장충동 스타일의 족발이 아니라 국물 자작한 족탕을 먹었다. 구례군 김인호 홍보팀장은 “고기가 귀하던 시절 족탕은 보양식이나 산후조리 음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설명했다.

가오리 살은 순면 이불처럼 부드럽다. 부추와 함께 양념간장을 찍어서 먹는다.
족탕(중 2만원, 대 3만원) 맛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콜라젠 덩어리 살을 우걱우걱 씹다가 청양고추를 넣은 국물을 떠먹으면 느끼함이 중화되는 기분이었다. 가오리찜(중 2만5000원, 대 3만5000원) 맛도 각별했다. 생선 살이 순면 이불처럼 보들보들했다. 김길엽(74) 사장은 “돼지 족은 집에서 3시간 삶아오고, 가오리는 하루 말린 걸 쓴다”며 “번거로운 준비 과정 때문에 웬만한 식당에서 족탕은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몰디브 바다 빛 닮은 청록빛 육수
구례를 가면 다슬기 수제비 한 그릇을 꼭 먹는다. 강이나 하천을 낀 고장에서 다슬기탕은 흔하게 팔지만, 다슬기 수제비를 먹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구례에서는 예부터 다슬기 수제비를 먹었다. 섬진강에 다슬기는 흔하고 쌀은 비싸던 시절, 다슬기 수제비는 든든하면서도 영양 넘치는 한 끼니였다.

토지다슬기식당에서 맛본 다슬기 수제비. 국물 색깔이 바다빛깔처럼 파랗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과 붙어 있는 구례 토지면에 다슬기 수제비 전문 식당이 모여 있다. 28일 아침 ‘토지다슬기식당’을 가봤다. 이 식당의 수제비(8500원)는 국물 빛이 남달랐다. 몰디브 바다가 떠오르는 영롱한 청록빛이었다. 부추를 갈아 넣었다는 수제비 반죽 때문에 국물이 더 파래 보였다. 왕경순(58) 사장은 “수입산 다슬기를 쓸면 절대 이런 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토지다슬기식당은 왕 사장의 동생 왕상윤씨가 잡은 섬진강 다슬기만 쓴단다. 구례에서 섬진강 다슬기 어획 자격을 가진 사람은 왕씨를 포함해 10명뿐이다.

토지다슬기식당은 섬진강에서 잡은 다슬기만 쓴다. 지난 여름 수해 여파로 다슬기 어획량이 3분의 1로 줄었단다.
독특한 빛깔만큼 국물 맛이 돋보였다. 보기엔 맑았지만, 깊고 진한 다슬기 향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하루 전 반죽해서 숙성했다는 수제비는 야들야들해서 국수처럼 술술 넘어갔다. 왕 사장은 “다슬기도 제철이 있다”며 “산란천인 여름을 앞둔 4~6월 다슬기가 가장 맛있다”고 설명했다.
백반만 시켜도 20찬이 쫙
아침을 먹고 구례읍 오일장을 둘러봤다. 대중가요 덕에 유명해진 건 이웃 마을 화개장터이지만 규모 면에서는 구례 오일장이 압도한다. 평균 5000~6000명이 방문하는데 벚꽃 시즌에는 1만5000명 이상이 찾는단다. 이날도 북적북적했다. 70년 가까이 뻥튀기 장사를 해온 고익용(89)씨가 기운 좋게 강냉이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푸릇푸릇한 산나물을 사고파는 장 풍경을 보고 나니 구경꾼까지 들뜨는 기분이었다.

구례 오일장 풍경. 70년 가까이 시장에서 뻥튀기를 판 고익용씨는 구례 오일장의 살아 있는 역사다.
마지막 식사를 위해 화엄사 쪽으로 향했다. 펜션과 식당이 모여 있는 화엄사 입구에 산채 정식을 잘하는 식당이 많다. 46년 역사의 ‘지리산식당’이 그중 하나다. 흙돼지구이·능이백숙 같은 메뉴도 있었지만 가장 대중적인 산채백반(1만원)을 시켰다. 웬만한 한정식집 뺨치는 상차림이 깔린다는 소문을 들어서였다.
헛소문이 아니었다. 된장찌개까지 20가지 반찬이 상을 가득 채웠다. 남도에서 백반을 먹으면 김치만 네댓 종이 나오곤 하는데 지리산식당은 아니었다. 김치는 배추김치 딱 하나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산나물이었다. 고춧잎, 쑥부쟁이, 신선초 등 모든 나물이 싱그러운 봄 향기를 머금고 있었다. 남도 음식치고는 간이 심심해서 어떤 반찬도 물리지 않았다. 1만원에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황송했다.

지리산식당에서 먹은 산채 백반. 된장찌개를 포함해 스무가지 반찬이 상에 깔린다. 어느 반찬 하나 대충 만든 게 없다.
지리산식당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아침에는 전날 만들어둔 찬이 나오니 신선한 반찬을 맛보고 싶다면 점심에 찾는 게 좋다. 버섯 전골을 시키면 엄나무순장아찌, 곰취나물처럼 귀한 나물 두 종을 더 내준단다.
구례=글·사진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닭 육회, 돼지 족탕…난생처음 먹어본 소감은요 [일일오끼]
' 먹거리 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막걸리에 과일청을? 막걸리 칵테일 레시피 5 (0) | 2021.06.10 |
|---|---|
| 입맛 없는 여름, 나물 반찬은 어때? (0) | 2021.06.10 |
| 참외 효능과 부작용 (0) | 2021.06.03 |
| 맛있는 새우의 효능과 섭취 시 주의 사항 (0) | 2021.06.03 |
| ‘죽음과 맞바꿀 극상의 맛’ 임진강 봄철 진객 ‘황복’ 돌아왔다 (0) | 2021.05.15 |



